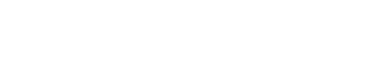중세와 르네상스의 문화 레폿 자료.
- 생활정보
- 2007. 12. 13. 02:58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은 별다른 고민없이 '이것과 저것은 틀리다'고 말한다.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데도 말이다. 언어가 언중의 뜻대로 바뀌어가는 것임을 인정한다 해도, 이 현상에는 간과할 수 없는 집단적 무의식이라 부를 만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한 채로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인가가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의 반대항이 맞다는 사실, 다시 말해 무언가 정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맞다/틀리다의 관계를 '다름(차이)'의 현상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대중의 습관, 즉 관습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얼른 떠오르는 장면은 대략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거치는 '정답 위주의 교육'현장이다. 항상 '정답'만을 찍어야 한다고 배워왔기에, 어느 새 세상을 맞다/틀리다의 범주로 나누는 것이 확고한 인식틀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론은 너무 표피적이라는 인상을 줄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왜 '정답만을 찍어야 한다'는 교육이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수 있다. 여기에는 푸코가 에피스테메라 부른 기저층위가 존재하는 듯하다. 맞다/틀리다의 세계관은 서구 역사의 심층에 자리하여 그 역사의 파도를 조종해온, 그리하여 마침내 근대에 이르러 그 존재가 밝혀진 '기하학주의'의 한 작은 지류라 할 수 있다.
초월자의 상실/빛의 편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른바 거룩한 장소를 정하여 그곳에 이른바 신의 집을 건축하고 '빛의 모자이크'로 신과의 소통을 염구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빛이 가지는 의미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빛이 가지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점이다. 전기를 통한 인공의 빛으로 둘러싸인 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빛이란 거의 공기와도 같은 것이다. 물론 특별한 빛이 있긴 하다. 예컨대, 갖가지 색깔과 모양의 전구들로 이루어진 루미나리에 축제의 경우, 거기서의 빛은 의식의 차원으로 떠오른 '새삼스런' 빛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빛은 스테인드글라스나 사원의 높은 유리창으로 통해 쏟아져 내리는 '신의 빛' 속에서 기도를 올렸던 사람들이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사원에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제외하면, 어두침침하고 음습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일할 시간을 알려주는 햇빛 속에서 일하거나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했을 것이다. 요컨대 그들에게는 빛보다 어둠이 훨씬 익숙했을 것이며, 어둠 속에서의 생활이 그들의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어둠이 무서워서/싫어서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원에 들어가는 일은, 그것이 비록 반복되는 것이라 해도,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그 시간은 바로 어두운 일상에서 벗어나 밝은 기쁨과 황홀경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일을 무의식 중에도 별 어려움없이 할 수 있는 현대인의 신체적 무의식은 결코 그런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을 수용하지 못한다. 빛은 어디에나 있고, 하늘이 어두워진다 해도 여전히 세상은 밝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밝음은 사실 언제라도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움베르토 에코가 <<포스트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에서 잘 보여주었듯이, 한 도시의 발전시설에 이상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밝음에 억눌려 있던 어둠은 몇 배나 더 강력한 기세로 몰려와 사람들을 짓누른다. 정전사태를 경험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보고 듣는다.
성스러운 사원이 오늘날에는 관광지 내지는 박물관이 되었음.
형식화의 의지. 형식화의 무근거성.
세계종교와 화폐, 그리고 네이션.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