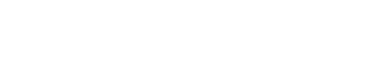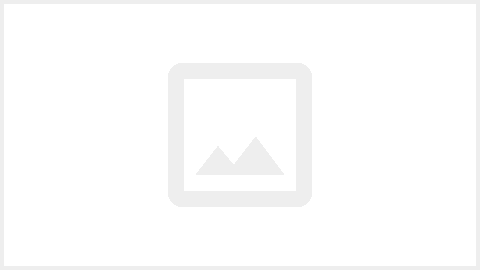번역과 주체1-일본어판 서문
- 생활정보
- 2007. 9. 13. 11:50
만약에 번역을 한 언어의 한 단어와 다른 언어의 한 단어 사이의 의미의 동일성을 매개로 한 1대 1 대응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subject는 분명히 휘포케이메논의 오역이다.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주체' 또한 subject의 오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번역과 subject'를 두 가지 주제의 병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subject가 번역에 접혀진 것으로도 본다면 subject와 휘포케이메논 사이가 단순히 역사적 거리에 의해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철학.정치적 문제권으로서 subject의 영역이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역과 주체'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말할 수 있다. subject를 일본어로 번역한다는 작업은 언뜻 보기에 단순히 어학적인, 좁은 의미의 기술적 문제로 보이면서도, 엄밀하게 고찰된 기술문제가 항상 그렇듯이, 어원학이나 어학의 습관화된 절차에 관한 논의 속에 가둘 수 없어서 철학.정치.역사적 문제권으로서의 '주체'의 '주제'영역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며, 일본어와 영어라는 상정된 언어의 통일성을 문제시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역과 관련해서 subject를 고찰하는 것은 하나의 명사로서의 '주체'의 번역뿐 아니라 반드시 '번역' 행위의 주체의 문제를 유인하고 만다. 번역은 스스로의 언어, '우리'의 언어 이외의 것에 대한 참조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주체' 또한 사실은 자기 또는 자기들 이외의 것, 즉 '타자'와의 관계 없이는 생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체'는 정반대로 이해되고 있으며, 가장 소박한 차원에서는 '진정한 자기' 또는 '자율적인 자기' 정도의 의미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주체는 표상하는 나와 표상되는 나(=주제화된 경우에 한에서의 나)라는 분열의 메커니즘을 통해 자기를 자기에게 표상하는 자로서의 근대적 주체=주관성으로 이해될 때도 있다. 어쨌거나 주체는 마치 자기완결적인 존재자처럼 설정된다. 자기완결적인 회로는 때로 국민문화라고 불리기도 하고 국민의 전체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의 자기완결적인 폐쇄영역으로 표상된 언어와 다른 자기완결적인 폐쇄영역으로 표상된 언어 사이의 의미교환으로서, 소통모델에 의해 번역을 이해하려 한다. 그렇다면 '주체'의 번역과 '번역'의 주체라는 두 가지 심급을 포개서 고찰하면 주체라는 개념이 자칫하면 은폐해버리는, 번역의 본질적 사회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태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19)
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청중집단을 위한 글쓰기를 통해 나는 국민국가의 담론과 쌍형상화 도식에 의지하지 않고도 번역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나아가 언어간 번역이라는 도식에 호소하지 않고도 번역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해주는 일련의 수사법(trope)을 개발할 기회를 얻었다. 번역을 다르게 분절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당연하게도 번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몇 가지 표현의 양의성에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다. 언어가 여러 개가 아니라면 번역이라는 것은 불필요해 보이지만 과연 언어의 복수성이라는 것을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언어를 수적으로 셀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 무엇이 또 하나의 언어나 다른 언어군에 포섭되지 않는 단일 언어의 통일체를 구성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조건 아래서 우리는 영어나 일본어를 복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 여기는 것일까? 그리고 '유럽어'나 심지어는 '서양어'라는 명칭으로 표시되는 어족을 언급함으로써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대답해야 할 것은 번역이 수행되는 그 상황을 번역 자체가 어떻게 구조화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도대체 번역이란 어떤 사회적 관계인가? (47,8)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청중집단을 위한 글쓰기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균질언어적 말걸기의 자세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 즉 균질적인 언어공동체로 상정된 것의 대표라는 입장을 취한 말하는이가 똑같이 균질적인 언어공동체로 대표하는 일반적인 듣는이들을 향해 말을 거는 그런 발화행위이다. 여기서 균질언어적 말걸기의 자세라는 말로 말하려는 것이, 말하는이와 듣는이가 동일한 언어공동체에 속한다고 상정되는 대화의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자. 서로가 다른 언어에 속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균질언어적으로 말을 걸 수는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라는 인칭대명사나 다른 집단적 부름(invocation)의 표시들의 용법에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었으며, 가능한 나의 청중을 언어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들의 총체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상호이해도 투명한 의사소통도 보장되지 않는 '우리' 속에서 나는 말하고 들으며 쓰고 읽도록 노력했던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걸어서 환기시키고자 한 '우리'라는 상정된 집단성은, 대화에서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이해가 보장된다고 가정된 확신 위에 구축된 공통성을 지닌 언어공동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우리' 속에서 '우리'는 오해 뿐만 아니라 이해의 결여와 항상 부딪쳐야 한다. 이렇듯 '우리'는 본질적으로 뒤섞인 청중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속에서는 말하는이와 듣는이의 관계를 잡음없는 공감의 전이로서 상상할 수 없고, '우리'라고 하면서 그러한 청중들에게 말을 거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를 보장받을 수도 없고 틀에 박힌 대답을 예상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듣는이들에게 손을 뻗는 일이 된다. '우리'는 오히려 비집성적 공동체이며, 듣는이는 완전히 의미작용을 놓쳐버리는 영도(零度)의 경우도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 정도로 내 발언에 응답할 것이다. 나는 말하는이와 듣는이가 관계하는 이러한 방식을 이언어적 말걸기의 자세라고 부르고 싶다. (48,9)
이 글을 공유하기